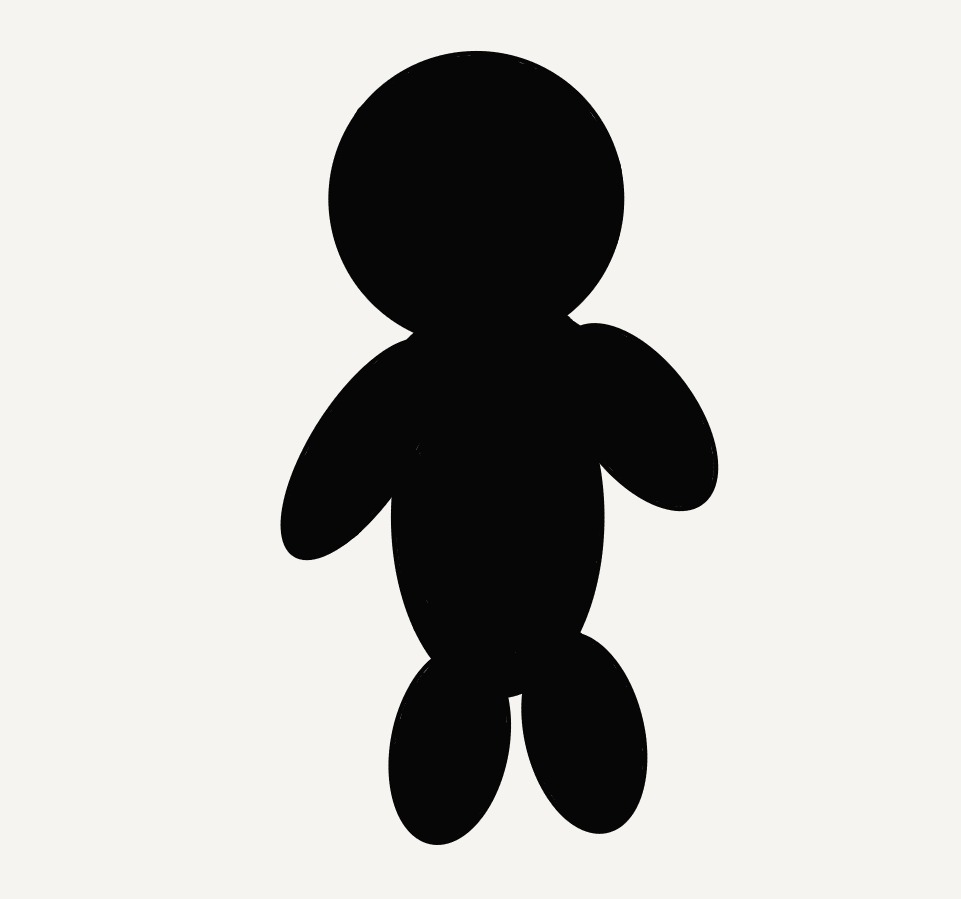티스토리 뷰
2018년 9월에부터 2019년 12월인 지금은 1년 3개월차 박사과정 학생이다. 슬슬 실적을 내놓아야 하는데, 진도를 제대로 빼지 못하고 있다. 매 스텝이 턱턱턱 다 막히고, 진척을 내놓을 수가 없다.
나는 사람이 비유로 사고하는 과정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하면서 박사과정을 왔다. 컴퓨터공학을 하는 사람의 질문은 아니고 인문학 하는 사람의 질문이기는 하지만, 기계학습이든 사람학습이든 아무튼 학습 이니까, 구체화를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이지 어떻게든 엮을 수는 있겠거니 싶었다. 그동안 교수님이랑 미팅을 하면서 일이 구체화가 되고, 문제도 명확해지고, 그래서 contextualized dialogue generation문제를 풀자고 마음을 먹었다. 맥락은 잘 맞는다. 여기 처음 오던 그때부터 잘 맞았고, 아직도 잘 맞는다. 나는 이 문제 바깥으로 눈을 돌릴 생각이 없다.
작년에 왔을 때는 매우 의욕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논문도 잡고 저 논문도 잡고 그랬다. 그런데 요즘은 하도 집중이 안 되다보니, 이게 내 적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구현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내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내가 이 분야에 가치를 못 느끼고 있어서 그런가 싶기도 했는데, 전부 아닌 것 같다.
여덟시간째 돌아가는 중인 코드를 돌려놓고, 글을 줄줄 써본다.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알아봐야겠다.
좋은 연구자는 종합 예술가와 같다는 포스팅 (http://gradschoolstory.net/author/pelexus/)을 읽은 적이 있다.
- 글을 잘 써야 한다.
- (컨셉)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
- 발표를 잘 해야 한다.
- 사람들과 잘 협업해야 한다.
이 중에서 내가 못하는 건 하나도 없다. 연구자 지망생을 하기 한참 전부터 글은 쏟아내면서 살았고, 컨셉 그림도 많이 그려봤고, 발표도 강의도 많이 해봤고, 사람들 동기를 끌어내서 같이 놀면서 일하는 모양새도 잘 만들어내는 편이다. 연구 라는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내가 불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머신러닝이라는 분야에서는, 수학적으로 깊이가 있으면 아주 유리하고, 코드를 자유롭게 만질 수 있어도 아주 유리하다. 둘 다 나는 약한 편이긴 하지만, 주변에 잘하는 남들보다 약하다는 소리고, 이것들도 아주 못하는 건 아니다. 영어로 읽거나 말하기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박사과정 공부를 감당하는 기본 소양이라는게 있다면 나는 탁월하지는 못할지언정 부족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럼 나는 뭐가 문제인가?
나는 배우의 눈이 아니라 관객의 눈으로 내 연구를 보고 있다. 이 연구가 내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나는 이런저런 문제가 많고 단점도 많은 사람이지만, 연구라는 일만 놓고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다.
논문의 모든 개념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 연구에 필요한 개념이라면 콕 찍어서 확실하게 틀어잡을 수 있어야 하고, 웹 앱 모바일 온갖 구현 테크닉을 전부 다 구사할 수는 없지만 연구에 필요한 구현이라면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노가다를 무릅쓰고 단어 하나하나를 아주 장시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내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니 훌렁훌렁 겉핥기 이상의 깊이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일주일 단위로 미팅이 있으니 꼭 일주일 단위의 일만 꼭 맞춰서 하려고 든다. 9 to 6로 일하는 직장인 마인드다. 나는 내가 하는 연구의 주인이 아니다. 지금 나는 관객이다.
왜 그렇게 되었나?
사람이 관객의 눈을 갖게 되는 이유는, 내 생각에, 정해진 것들에 둘러싸였을 때라고 생각한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받는 월급이 정해지고, 해야 할 일이 정해지고, 미팅 일정이 정해지고, 그렇게 나의 일상을 규제하면서 나의 의지로 어쩔 수 있는건 아닌 일들이 많이 고정될수록 사람은 진짜 일을 손에 잡지 못하고 멀뚱히 팔짱을 끼게 된다. 고정되어서 어쩔 수 없다 라는 인식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
반대로 배우의 눈을 갖게 되는 때는, 나에게 정해진 것이 있으되 정해진 것을 내가 부수거나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배우는 어느 타이밍에 말해야 할 대사가 전부 대본에 정해져 있지만, 배우가 그것을 입밖으로 낼 때는 순간 감정에 따라, 관객의 호응에 따라, 파트너의 상태에 따라 다 달라진다. 정해진 대본 위에서 요란하게 춤추는 배우일수록 온 힘을 다해서 그 순간에 몰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동적일 때 겪는 몰입이다.
동적이냐 정적이냐 하는 문제는, 나의 기호, 나의 소양, 나의 역량 그런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아무리 고착화된 직장인 마인드로 사는 사람이라도 눈앞에 호랑이가 나타나면 태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려죽을게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뭐라도 해서 상황을 바꾸려 버둥대게 된다. 내 생각에는, 세상 거의 모든 일은 유동적이고 전부 어쩔 수 있는 것들 뿐이다.

위 그림에는 혼돈의 세상에서 어떤 패턴을 읽고 정제해서 질서로 만들어놓은 사람의 지식, 논문이 그려져 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논문을 죽은 것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논문을 산 것으로 본다. 종이로 출력된 논문이 죽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 위에다가 활기를 불어넣느냐 아니냐는 그 사람에게 달린 것이다. 뻔한 대본을 살아있는 것으로 배우가 읽어내듯이. 뻔한 악보를 연주자가 살아있는 것으로 읽어내듯이. 논문도 그런 맥락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코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나?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미팅이 정해져있으므로, 나는 2~3일에 한번씩 교수님에게 뭔가를 보내야 한다. 실험결과가 똥이든 뭐든 간에.
해야 할 일이 무엇무엇이면, 나는 거기다가 내가 정한 뭔가를 더 얹어서 내놓아야 한다.
내가 풀어야 하는 문제가 무엇무엇이면, 나는 그 문제랑 유관한 서브 문제라든지, 아무튼 그것 위에서 뭔가를 더 내놓아야 한다.
내가 읽는 논문에 적힌 글이 뭐라뭐라 하면, 나는 거기다 내가 정한 스토리를 더 얹어서 뭔 말이든 더 해야 한다.
배우가 고정된 자기 대사 위에 자기 감정을 싣듯이.
정해져 있는 것 위에다 살아있는 뭔가를 부여하려고 들어야 한다.
이게 일을 더 하라는 뜻은 아니다. 대본에 다 고정되어있는 대사를 배우가 읊는데, 거기다 자기 감정을 싣는다고 일을 더 하는건 아니지 않은가. 어차피 같은 일을 하는데, 기계처럼 읽느냐 생동감있게 읽느냐에 따라 몰입감은 달라진다. 고정된 그것에 동적인 면을 내가 얼마나 부여하느냐 하는 문제인듯 하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말도 아니다. 열심히는 내가 하는게 아니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그것에 얼마나 생명을 불어넣느냐에 따라서 다른것 같다. 죽은 것으로 대하느냐 산 것으로 대하느냐 그것이 문제일듯.
박사과정 기간 자체가 기본 4년으로 고정된 것이다 보니, 또 이 기간 안에 할 일들이 전부 고정되어 있다 보니, 내가 무심결에 나를 그 틀에 밀어넣고 이 기간 안에는 아무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합리화를 했던 것 같다. 그러니 생기가 다 죽고 축 쳐진 눈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 아닐까.
남이 짠 코드를 내가 고쳐야 할 때는 혹시나 망가뜨려 뒷처리가 곤란해질까봐 한참을 머뭇거리고는 했다. Git으로 버전관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실행되고 있는 코드를 가능하면 안 망가뜨리려고, 보수적으로 애쓰고는 했다. 논문을 읽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남이 그렇다고 했으니 그냥 그런 것으로, 인쇄되어 고정된 그대로를 안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부 나랑 관계없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던게 아닐까.
수백년전에 죽은 베토벤이 작곡한 음악을 현대 연주자들이 전부 자기 색깔로 다르게 연주하듯이, 꼭 그런 식으로 남의 논문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게 아닐까.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광기 컨트롤 (0) | 2019.12.26 |
|---|---|
| 질 (Quality), 필요 (Need) (0) | 2019.12.01 |
| 인생 패키지 (0) | 2019.11.22 |
| 나는 뭘 하고 앉았나... (2) | 2019.09.18 |
| 말은 마차 앞으로 (0) | 2019.08.31 |